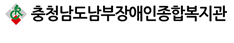시각 장애인, 황사 폭풍속 253㎞를 달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28 09:13 조회2,882회 댓글0건본문
'고비사막 극한마라톤' 6박7일… 본사 이석우 기자 동행 르포
 도우미와 한몸 우정… 기진 맥진… 만신창이
"왜 생고생을?" "나도 뛸수있다는것 보여주려"
“이형 나 믿지. 조금만 참아. 곧 이 코스 끝난다. 평탄한 길이 나오면 우리 둘이서 미친듯이 달리자.”
김경수씨가 이용술씨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끈으로 서로를 묶은 채 달리고 있다. 시각 장애인인 이씨를 김씨가 인도하기 위해서다. 여기는 고비사막. 6박7일 동안 253㎞를 달리는 극한마라톤 둘째 날인 25일이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구간은 어른 몸통 만한 돌과 주먹 만한 자갈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는 위태로울 정도로 휘청거린다. “헉헉….” 15㎞ 쯤 달리자 끝도 없는 모래천지가 나타난다. 내가 뛰고 있는 건지, 모래가 움직이는 건지….
22개국에서 참가한 90여명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매니아들이다. 사막마라톤이 열리면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온다. 참가비 포함해 500만원 이상의 만만치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극한적 체력을 요구하는 이벤트에 매달린다. 밑도 끝도 없는 모래에 자신을 던진다.
이날 총 30 km 구간을 달려 캠프에 도착한 것은 어슴프레 저녁 무렵. 이씨는 22개국 9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40등 수준으로 들어왔다. 자갈 구간에서는 후미로 뒤처졌던 이씨가 모래 구간에서 제 속력을 낸 탓이다. “왜 이런 고생을 하나요?”라고 묻자, 이씨의 대답은 단순했다. “장님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우미와 한몸 우정… 기진 맥진… 만신창이
"왜 생고생을?" "나도 뛸수있다는것 보여주려"
“이형 나 믿지. 조금만 참아. 곧 이 코스 끝난다. 평탄한 길이 나오면 우리 둘이서 미친듯이 달리자.”
김경수씨가 이용술씨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끈으로 서로를 묶은 채 달리고 있다. 시각 장애인인 이씨를 김씨가 인도하기 위해서다. 여기는 고비사막. 6박7일 동안 253㎞를 달리는 극한마라톤 둘째 날인 25일이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구간은 어른 몸통 만한 돌과 주먹 만한 자갈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는 위태로울 정도로 휘청거린다. “헉헉….” 15㎞ 쯤 달리자 끝도 없는 모래천지가 나타난다. 내가 뛰고 있는 건지, 모래가 움직이는 건지….
22개국에서 참가한 90여명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매니아들이다. 사막마라톤이 열리면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온다. 참가비 포함해 500만원 이상의 만만치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극한적 체력을 요구하는 이벤트에 매달린다. 밑도 끝도 없는 모래에 자신을 던진다.
이날 총 30 km 구간을 달려 캠프에 도착한 것은 어슴프레 저녁 무렵. 이씨는 22개국 9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40등 수준으로 들어왔다. 자갈 구간에서는 후미로 뒤처졌던 이씨가 모래 구간에서 제 속력을 낸 탓이다. “왜 이런 고생을 하나요?”라고 묻자, 이씨의 대답은 단순했다. “장님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들 제 한몸 못가눠 널브러져 있는데, 김경수씨는 물로 이씨의 발을 식혀주고 있다. 이어 누우라고 자리도 깔아 준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03년 사하라 사막 대회 때였다고 한다.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인 김씨는 21일 인천공항을 떠날 때부터 이씨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우정(友情)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기사를 쓰고 있는 이 시각, 선수들이 묵는 10인용 천막이 요동치고 있다. 다들 언제 날아 갈지 모르는 천막을 붙들고 씨름 중이다. 식사시간이 됐지만 좀처럼 나올 줄을 모른다. 방향도 알기 어려운 모래 소용돌이 때문이다. 천막 안은 물론 침낭, 코펠, 식량까지 모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귀와 콧구멍, 배꼽에까지 누런 먼지가 가득 차 있다. 밥도 흙먼지를 양념 삼아 먹어야 한다. 하늘도 누렇고, 사람도 누렇다. 이곳이 바로 황사의 발원지다. 이 모래는 2~3일 뒤엔 2000㎞ 정도 떨어진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도대체 왜 사막으로 왔는가.” 기자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다. 무릎은 서 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 오늘 진통제를 네 알이나 먹었다. 그런데도 진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추위는 뼈를 찌른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지금은 영하다.
솔직히, 첫날인 어제(24일) 32㎞ 구간부터는 기가 팍 질렸다. 게다가 오르막이 계속 이어졌다. 극한 마라톤 베테랑 선수들도 “이번에는 첫날부터 사람 잡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12㎏의 짐을 어깨에 매고 달리는 것은 극한의 인내를 요구했다.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점심 식량을 덜어 냈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콜릿을 덜어냈다.
오늘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신기할 정도다. 해발 1400m에서 출발한 코스가 최고 2100m 까지, 위로만 이어진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에 4㎞를 달린 뒤부터는 뛰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 “걸어서라도 이 레이스를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모래 바닥에 주저 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일을 걱정할 힘마저 없다.
[조선일보]
모두들 제 한몸 못가눠 널브러져 있는데, 김경수씨는 물로 이씨의 발을 식혀주고 있다. 이어 누우라고 자리도 깔아 준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03년 사하라 사막 대회 때였다고 한다.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인 김씨는 21일 인천공항을 떠날 때부터 이씨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우정(友情)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기사를 쓰고 있는 이 시각, 선수들이 묵는 10인용 천막이 요동치고 있다. 다들 언제 날아 갈지 모르는 천막을 붙들고 씨름 중이다. 식사시간이 됐지만 좀처럼 나올 줄을 모른다. 방향도 알기 어려운 모래 소용돌이 때문이다. 천막 안은 물론 침낭, 코펠, 식량까지 모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귀와 콧구멍, 배꼽에까지 누런 먼지가 가득 차 있다. 밥도 흙먼지를 양념 삼아 먹어야 한다. 하늘도 누렇고, 사람도 누렇다. 이곳이 바로 황사의 발원지다. 이 모래는 2~3일 뒤엔 2000㎞ 정도 떨어진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도대체 왜 사막으로 왔는가.” 기자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다. 무릎은 서 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 오늘 진통제를 네 알이나 먹었다. 그런데도 진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추위는 뼈를 찌른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지금은 영하다.
솔직히, 첫날인 어제(24일) 32㎞ 구간부터는 기가 팍 질렸다. 게다가 오르막이 계속 이어졌다. 극한 마라톤 베테랑 선수들도 “이번에는 첫날부터 사람 잡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12㎏의 짐을 어깨에 매고 달리는 것은 극한의 인내를 요구했다.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점심 식량을 덜어 냈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콜릿을 덜어냈다.
오늘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신기할 정도다. 해발 1400m에서 출발한 코스가 최고 2100m 까지, 위로만 이어진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에 4㎞를 달린 뒤부터는 뛰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 “걸어서라도 이 레이스를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모래 바닥에 주저 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일을 걱정할 힘마저 없다.
[조선일보]
 도우미와 한몸 우정… 기진 맥진… 만신창이
"왜 생고생을?" "나도 뛸수있다는것 보여주려"
“이형 나 믿지. 조금만 참아. 곧 이 코스 끝난다. 평탄한 길이 나오면 우리 둘이서 미친듯이 달리자.”
김경수씨가 이용술씨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끈으로 서로를 묶은 채 달리고 있다. 시각 장애인인 이씨를 김씨가 인도하기 위해서다. 여기는 고비사막. 6박7일 동안 253㎞를 달리는 극한마라톤 둘째 날인 25일이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구간은 어른 몸통 만한 돌과 주먹 만한 자갈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는 위태로울 정도로 휘청거린다. “헉헉….” 15㎞ 쯤 달리자 끝도 없는 모래천지가 나타난다. 내가 뛰고 있는 건지, 모래가 움직이는 건지….
22개국에서 참가한 90여명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매니아들이다. 사막마라톤이 열리면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온다. 참가비 포함해 500만원 이상의 만만치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극한적 체력을 요구하는 이벤트에 매달린다. 밑도 끝도 없는 모래에 자신을 던진다.
이날 총 30 km 구간을 달려 캠프에 도착한 것은 어슴프레 저녁 무렵. 이씨는 22개국 9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40등 수준으로 들어왔다. 자갈 구간에서는 후미로 뒤처졌던 이씨가 모래 구간에서 제 속력을 낸 탓이다. “왜 이런 고생을 하나요?”라고 묻자, 이씨의 대답은 단순했다. “장님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우미와 한몸 우정… 기진 맥진… 만신창이
"왜 생고생을?" "나도 뛸수있다는것 보여주려"
“이형 나 믿지. 조금만 참아. 곧 이 코스 끝난다. 평탄한 길이 나오면 우리 둘이서 미친듯이 달리자.”
김경수씨가 이용술씨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끈으로 서로를 묶은 채 달리고 있다. 시각 장애인인 이씨를 김씨가 인도하기 위해서다. 여기는 고비사막. 6박7일 동안 253㎞를 달리는 극한마라톤 둘째 날인 25일이다.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구간은 어른 몸통 만한 돌과 주먹 만한 자갈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그는 위태로울 정도로 휘청거린다. “헉헉….” 15㎞ 쯤 달리자 끝도 없는 모래천지가 나타난다. 내가 뛰고 있는 건지, 모래가 움직이는 건지….
22개국에서 참가한 90여명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매니아들이다. 사막마라톤이 열리면 천리를 마다않고 달려온다. 참가비 포함해 500만원 이상의 만만치않은 비용이 드는 데다 극한적 체력을 요구하는 이벤트에 매달린다. 밑도 끝도 없는 모래에 자신을 던진다.
이날 총 30 km 구간을 달려 캠프에 도착한 것은 어슴프레 저녁 무렵. 이씨는 22개국 90여명의 참가자 가운데 40등 수준으로 들어왔다. 자갈 구간에서는 후미로 뒤처졌던 이씨가 모래 구간에서 제 속력을 낸 탓이다. “왜 이런 고생을 하나요?”라고 묻자, 이씨의 대답은 단순했다. “장님도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두들 제 한몸 못가눠 널브러져 있는데, 김경수씨는 물로 이씨의 발을 식혀주고 있다. 이어 누우라고 자리도 깔아 준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03년 사하라 사막 대회 때였다고 한다.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인 김씨는 21일 인천공항을 떠날 때부터 이씨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우정(友情)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기사를 쓰고 있는 이 시각, 선수들이 묵는 10인용 천막이 요동치고 있다. 다들 언제 날아 갈지 모르는 천막을 붙들고 씨름 중이다. 식사시간이 됐지만 좀처럼 나올 줄을 모른다. 방향도 알기 어려운 모래 소용돌이 때문이다. 천막 안은 물론 침낭, 코펠, 식량까지 모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귀와 콧구멍, 배꼽에까지 누런 먼지가 가득 차 있다. 밥도 흙먼지를 양념 삼아 먹어야 한다. 하늘도 누렇고, 사람도 누렇다. 이곳이 바로 황사의 발원지다. 이 모래는 2~3일 뒤엔 2000㎞ 정도 떨어진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도대체 왜 사막으로 왔는가.” 기자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다. 무릎은 서 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 오늘 진통제를 네 알이나 먹었다. 그런데도 진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추위는 뼈를 찌른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지금은 영하다.
솔직히, 첫날인 어제(24일) 32㎞ 구간부터는 기가 팍 질렸다. 게다가 오르막이 계속 이어졌다. 극한 마라톤 베테랑 선수들도 “이번에는 첫날부터 사람 잡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12㎏의 짐을 어깨에 매고 달리는 것은 극한의 인내를 요구했다.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점심 식량을 덜어 냈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콜릿을 덜어냈다.
오늘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신기할 정도다. 해발 1400m에서 출발한 코스가 최고 2100m 까지, 위로만 이어진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에 4㎞를 달린 뒤부터는 뛰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 “걸어서라도 이 레이스를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모래 바닥에 주저 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일을 걱정할 힘마저 없다.
[조선일보]
모두들 제 한몸 못가눠 널브러져 있는데, 김경수씨는 물로 이씨의 발을 식혀주고 있다. 이어 누우라고 자리도 깔아 준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2003년 사하라 사막 대회 때였다고 한다. 서울 강북구청 공무원인 김씨는 21일 인천공항을 떠날 때부터 이씨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잠을 잘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우정(友情)은 자연 속에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는가.
기사를 쓰고 있는 이 시각, 선수들이 묵는 10인용 천막이 요동치고 있다. 다들 언제 날아 갈지 모르는 천막을 붙들고 씨름 중이다. 식사시간이 됐지만 좀처럼 나올 줄을 모른다. 방향도 알기 어려운 모래 소용돌이 때문이다. 천막 안은 물론 침낭, 코펠, 식량까지 모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귀와 콧구멍, 배꼽에까지 누런 먼지가 가득 차 있다. 밥도 흙먼지를 양념 삼아 먹어야 한다. 하늘도 누렇고, 사람도 누렇다. 이곳이 바로 황사의 발원지다. 이 모래는 2~3일 뒤엔 2000㎞ 정도 떨어진 한국에 도착할 것이다.
“나는 도대체 왜 사막으로 왔는가.” 기자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다. 무릎은 서 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느껴진다. 오늘 진통제를 네 알이나 먹었다. 그런데도 진통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추위는 뼈를 찌른다.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갔던 기온이 지금은 영하다.
솔직히, 첫날인 어제(24일) 32㎞ 구간부터는 기가 팍 질렸다. 게다가 오르막이 계속 이어졌다. 극한 마라톤 베테랑 선수들도 “이번에는 첫날부터 사람 잡는다”며 혀를 내둘렀다. 12㎏의 짐을 어깨에 매고 달리는 것은 극한의 인내를 요구했다. 배낭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점심 식량을 덜어 냈다.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콜릿을 덜어냈다.
오늘도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신기할 정도다. 해발 1400m에서 출발한 코스가 최고 2100m 까지, 위로만 이어진 것을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에 4㎞를 달린 뒤부터는 뛰는 것 자체를 포기했다. “걸어서라도 이 레이스를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일 텐데….” 모래 바닥에 주저 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내일을 걱정할 힘마저 없다.
[조선일보]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