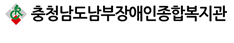‘올림픽 메달’이 더 서러운 장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21 13:38 조회4,044회 댓글0건본문
아테네 장애인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메달을 안긴 허명숙씨의 삶은 우리 사회의 ‘복지’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해준다. 허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은 뒤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30대 후반에 사격을 시작해 12년 만에 ‘열매’를 맺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생활보호 대상자 보조금 40만원이 ‘전 재산’이었기에 식탁은 늘 밥과 된장찌개가 전부였다.
은메달에 이어 금메달까지 딴 허씨의 삶은 그러나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달마다 연금이 나오지만, 그만큼 생보자 보조금이 공제된다. 게다가 연금을 받으면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없어지며, 생보자에서 제외될 경우엔 의료혜택도 사라진다. 당국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 아래선 어쩔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명하지만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복지 전반의 열악한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올림픽 메달을 딸 경우 일반인과 장애인의 연금 차이를 당장 해소해야 옳다. 일반 선수단이 전세기로 아테네에 직접 도착한 데 비해, 전세기가 참으로 필요한 장애인들은 여객기로 런던을 거쳐 간 것도 자성할 대목이다. 선수단의 절반이 휠체어를 타고 있어 옮겨 타는 데만 5시간 넘게 걸린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차별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훈련 지원이나 시설 사용에서도 냉대를 받는다. 가까스로 잡은 직장의 대다수가 올림픽 출전을 달갑게 여기지 않아 ‘일터’와 ‘체육’ 가운데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은 일반 선수들과 견줘 너무나 큰 차별이다.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걸 누가 봤다”는 한 참가 선수의 씁쓸한 토로 앞에, 정부 당국은 언제까지 ‘현실론’만 들먹일 셈인가. 장애인 선수들의 눈에 더는 서러움의 눈물이 맺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다.
<출처:한겨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