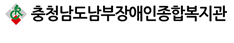'겨우 27kg…' 시한부 청년의 행복 만들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10 19:18 조회6,618회 댓글0건본문
지난 6일 충남 청양군 칠갑산 아래 도림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여럿이 찾아와 ‘누웠다’. 이들은 집 주인인 자그마한 청년 하나를 에워싸고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 이름은 김민식(25). 전신장애 1급에 시한부 삶을 사는 청년이다. 민식씨 옆에 누운 사람들은 민식씨를 ‘살아 있게’ 해준 자원봉사자들이다. 4월 장애인의 달 첫 주였다.
민식씨는 병을 앓고 있다. 병명은 근이영양증(muscle dystrophy). 온 몸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는 병이다. 초등학교 4학년 개학날, 새 교과서를 받고 집으로 오다가 트럭에 부딪혔다. 병원에서는 “타박상은 별 게 아닌데, 심각한 다른 병이 발견됐다”고 했다. 큰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무 살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몸은 조금씩 움츠러들어 스물 다섯 살 청년이 27㎏짜리 새털처럼 가벼운 몸뚱아리로 산다. “왜 사람들이 살을 빼는지 모르겠네”하고 농담을 하는 민식씨는 내장 근육도 약해져 여든 넘은 할머니가 넣어주는 밥풀과 물방울로 생명을 유지한다. 있는 힘 다해야 컴퓨터 키보드를 누를 수 있는 손가락, 그리고 웃음 가득한 얼굴에는 아직 근육이 남아 있다.
그런 그가 두 달 후면 스물 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다. 병원에서 선언한 시한을 5년이나 넘겼다. 그동안 겨우 기능하는 일부 신체 부위로 많은 일을 했다.

시(詩)를 썼다. 시집 두 권 가운데 한 권은 베스트셀러였다. ‘삶은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제목의 시집은 초판 매진에 재판까지 찍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4년 중퇴. 그래서 책 한 권을 이해하려면 수백 번씩 읽어야 했다. 그리고 작곡을 한다.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는 청년이 컴퓨터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 40여 곡을 완성했다. 민식씨는 “하늘이 부르는 날까지 그저 제 할 일 하면서 살 것”이라고 말했고,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다. 오로지 죽는 날까지 내 일을 하다 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뒷받침해준 주위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다.
그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1996년 어느 날 몰려왔다. 민식씨가 장애인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지 한 잡지에 기고한 직후였다. 처음 온 사람들은 공주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소망의 집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민식이를 씻겨주고 이부자리를 갈아주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사진가 장준(34)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민식씨를 찾아온다. 장씨는 “열댓 명씩 찾아와 며칠씩 한뎃잠 자며 민식이랑 놀았다”고 했다. 장씨는 밤에 서울 남대문 의류상가에서 일을 한다. 그 월급을 쪼개 지금도 매달 민식이에게 보낸다.
서수택(49·사업·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도 장준씨와 똑같다. “민식이 글을 읽으면서 내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 다음날 무작정 내려왔었다”고 말했다. 한 해에 서씨가 보내주는 돈은 수백만 원. IMF처럼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남 돕기란, 절약하면 마음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에서 약초농장을 하는 배대진(63) 할아버지도 수시로 민식이를 찾아와 약을 주고 간다. 할머니는 “또 누군가가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꾸준히 음식이랑 돈을 부쳐준다”고 했다.
“사람들이 오면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천장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민식씨 눈가에 웃음이 퍼진다.
이날 못 온 형·누나들은 미니홈피(www.cyworld.com/Eternity61)에 안부인사를 남겼다. 제일 보고 싶은 효심이 누나(26·교사)도 “곧 놀러오겠다”고 약속했다.
점심식사를 물리고, 사람들이 민식씨 옆에 누워 눈높이를 맞추며 말을 건넸다. “건강해라, 민식이.” 민식씨가 말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사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청양=박종인 기자 seno@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민식씨는 병을 앓고 있다. 병명은 근이영양증(muscle dystrophy). 온 몸 근육이 조금씩 사라지는 병이다. 초등학교 4학년 개학날, 새 교과서를 받고 집으로 오다가 트럭에 부딪혔다. 병원에서는 “타박상은 별 게 아닌데, 심각한 다른 병이 발견됐다”고 했다. 큰 병원에 데려갔더니 “스무 살 넘기기 어렵다”고 했다. 몸은 조금씩 움츠러들어 스물 다섯 살 청년이 27㎏짜리 새털처럼 가벼운 몸뚱아리로 산다. “왜 사람들이 살을 빼는지 모르겠네”하고 농담을 하는 민식씨는 내장 근육도 약해져 여든 넘은 할머니가 넣어주는 밥풀과 물방울로 생명을 유지한다. 있는 힘 다해야 컴퓨터 키보드를 누를 수 있는 손가락, 그리고 웃음 가득한 얼굴에는 아직 근육이 남아 있다.
그런 그가 두 달 후면 스물 다섯 번째 생일을 맞는다. 병원에서 선언한 시한을 5년이나 넘겼다. 그동안 겨우 기능하는 일부 신체 부위로 많은 일을 했다.

시(詩)를 썼다. 시집 두 권 가운데 한 권은 베스트셀러였다. ‘삶은 사는 것만큼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제목의 시집은 초판 매진에 재판까지 찍었다. 학력은 초등학교 4년 중퇴. 그래서 책 한 권을 이해하려면 수백 번씩 읽어야 했다. 그리고 작곡을 한다.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는 청년이 컴퓨터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여 40여 곡을 완성했다. 민식씨는 “하늘이 부르는 날까지 그저 제 할 일 하면서 살 것”이라고 말했고,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다. 오로지 죽는 날까지 내 일을 하다 가겠다는 그의 의지를 뒷받침해준 주위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다.
그를 돕는 자원봉사자들은 1996년 어느 날 몰려왔다. 민식씨가 장애인으로서 사는 삶이 어떤지 한 잡지에 기고한 직후였다. 처음 온 사람들은 공주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소망의 집 자원봉사자들이었다.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민식이를 씻겨주고 이부자리를 갈아주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사진가 장준(34)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민식씨를 찾아온다. 장씨는 “열댓 명씩 찾아와 며칠씩 한뎃잠 자며 민식이랑 놀았다”고 했다. 장씨는 밤에 서울 남대문 의류상가에서 일을 한다. 그 월급을 쪼개 지금도 매달 민식이에게 보낸다.
서수택(49·사업·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도 장준씨와 똑같다. “민식이 글을 읽으면서 내 어려웠던 시절이 생각나 다음날 무작정 내려왔었다”고 말했다. 한 해에 서씨가 보내주는 돈은 수백만 원. IMF처럼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남 돕기란, 절약하면 마음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에서 약초농장을 하는 배대진(63) 할아버지도 수시로 민식이를 찾아와 약을 주고 간다. 할머니는 “또 누군가가 이름도 알려주지 않고 꾸준히 음식이랑 돈을 부쳐준다”고 했다.
“사람들이 오면 외롭지 않아서 좋아요.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천장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민식씨 눈가에 웃음이 퍼진다.
이날 못 온 형·누나들은 미니홈피(www.cyworld.com/Eternity61)에 안부인사를 남겼다. 제일 보고 싶은 효심이 누나(26·교사)도 “곧 놀러오겠다”고 약속했다.
점심식사를 물리고, 사람들이 민식씨 옆에 누워 눈높이를 맞추며 말을 건넸다. “건강해라, 민식이.” 민식씨가 말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사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청양=박종인 기자 seno@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