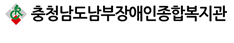“휠체어 타고 ‘인생 후반전’ 달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7-05 20:28 조회3,713회 댓글0건본문
하반신 마비 70년대 축구대표팀 황재만씨 휠체어 럭비 전도사로 ‘제2의 삶’ 출발
70년대 국가대표 축구팀의 간판 수비수로 그라운드를 주름잡던 황재만(53)씨가 ‘휠체어 럭비의 전도사’로 나섰다. 인생의 황금기인 30대 후반, 척수염 판정을 받고 휠체어에 주저앉은 그가 이제 한국휠체어럭비협회 준비위원장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다.
중동중·고와 고려대를 나온 황씨는 청소년대표를 거쳐 대학 2학년인 72년 태극마크를 단 당대의 ‘철벽 수비수’. 문전까지 연결되는 롱 드로잉으로 올드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차범근·박성화 감독이 그와 함께 뛴 대학 후배들이다.
비가 내리는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오금동 곰두리체육센터에서 휠체어 럭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렸다. 휠체어 위에 올라탄 사지마비·경추마비 장애인들이 치열한 공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휠체어 럭비는 농구 코트 규격의 경기장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며, 공을 가진 선수의 휠체어 바퀴가 엔드라인을 통과하면 득점으로 인정되는 경기. 각팀 4명의 선수가 8분씩 4피리어드 경기를 펼친다. 흐뭇하게 경기를 지켜보던 황씨가 ‘잘 나가던’ 축구선수·지도자에서 장애인이 된 사연을 전했다.
“축구 대표팀의 왼쪽 풀백으로 후회없는 선수생활을 보냈습니다. 1976년 12월 4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에서 헤딩 결승골을 넣어 2대1로 이겼을 때,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북한과 공동우승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80년 할렐루야 축구단으로 옮겨 선수로 뛰다, 83년 지도자로 나섰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을 이끌고 중남미, 동남아, 러시아까지 누비며 활발한 선교활동을 벌이던 그에게 병마의 그림자가 찾아든 것은 지난 86년. 멕시코 월드컵을 찾아 선교활동을 벌이고 귀국한 후 열병을 앓은 것이다.
“다리가 불편했지만 선수 때 다친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몸이 계속 안 좋았어요. 2년 뒤 척수염 판정을 받았고 90년 무렵 완전히 휠체어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수시절 172㎝, 72㎏이던 탄탄한 체구는 45㎏까지 떨어졌다.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휠체어를 구입하겠는 것도 한사코 말렸죠.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아내의 헌신적인 도움이 없었으면 삶을 쉽게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 총감독을 맡았던 할렐루야 축구단이 해체되며 축구계를 떠난 황씨는 올초 휠체어 럭비를 접하며 새 희망을 찾았다. 윤세완(45)씨가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아 그를 돕고 있다. 중앙대 체육학과(78학번) 출신인 윤씨는 지난 89년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다. 조용히 경기를 지켜보던 황씨가 입을 열었다.
“매일 집에서 천장만 보고 지내던 경추마비 장애인들에게 휠체어 럭비는 새로운 삶의 희망입니다. 보세요. 저 격렬한 움직임과 생명력을. 삶을 포기하려 했던 장애인들이 홀로 서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현재 휠체어 럭비가 보급된 나라는 30여개국. 지난 2000년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첫 걸음을 내디딘 한국 휠체어 럭비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장비문제. 경기용 휠체어 1대의 가격은 600여만원에 달한다.
황씨는 “럭비용 휠체어 100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 무대의 정상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
알림마당 ㆍ 뉴스레터